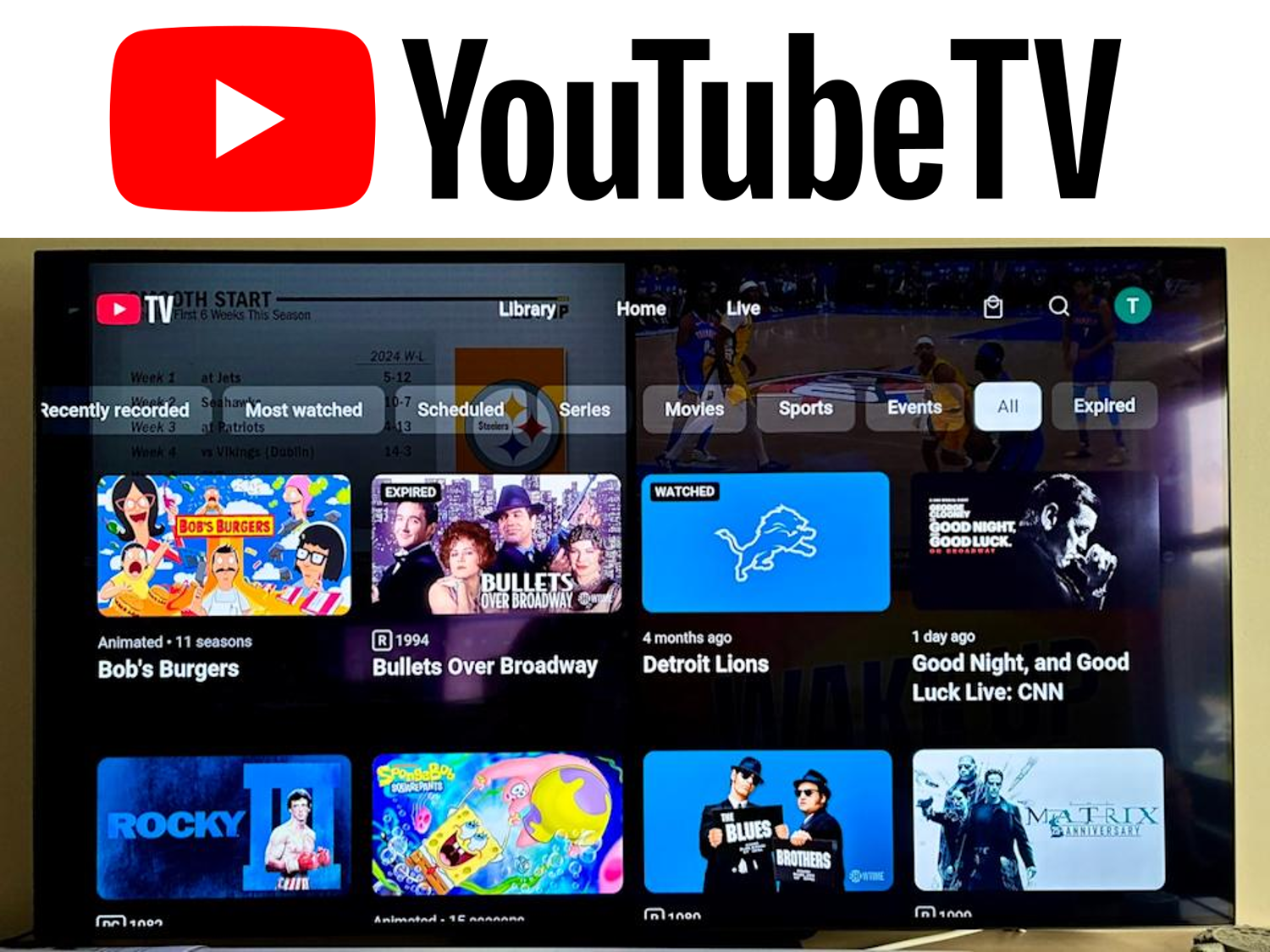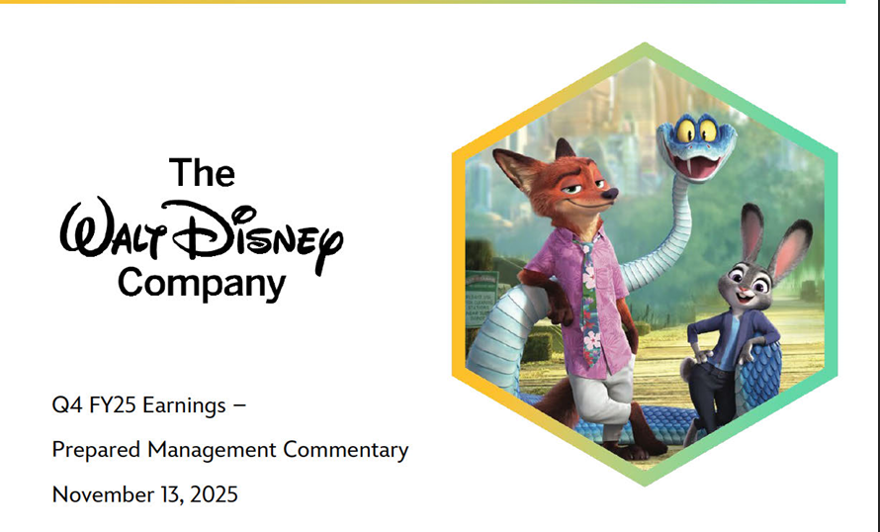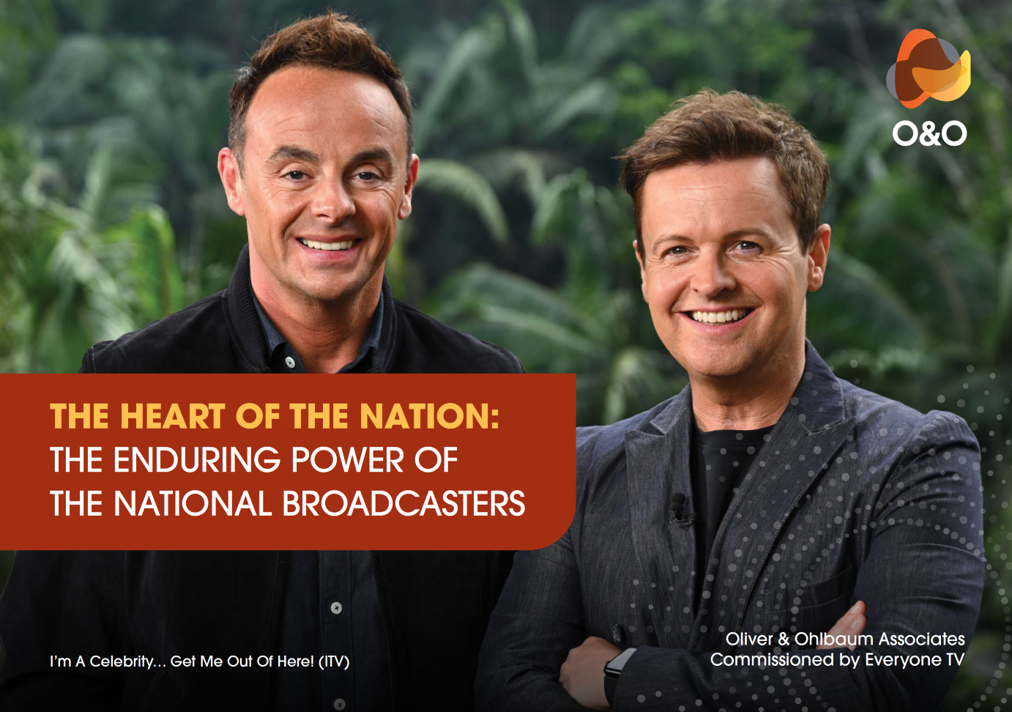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CMS)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애플TV+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영국 내 구독 수익(subscriber revenue)의 5%를 ‘문화기금(Cultural Fund)’으로 납부하도록 권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영국 의회는, 영국 내 프리미엄 드라마 제작 건수와 투자액이 감소하는 등 위기가 왔으므로, 자국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금을 걷어 영국 드라마 제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Adolescence〉 같은 드라마는 영국의 정체성과 사회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콘텐츠들이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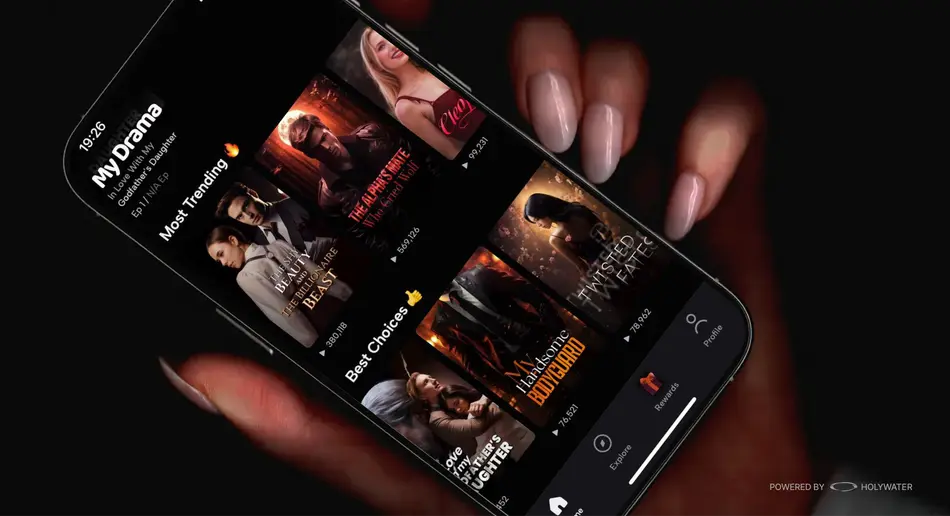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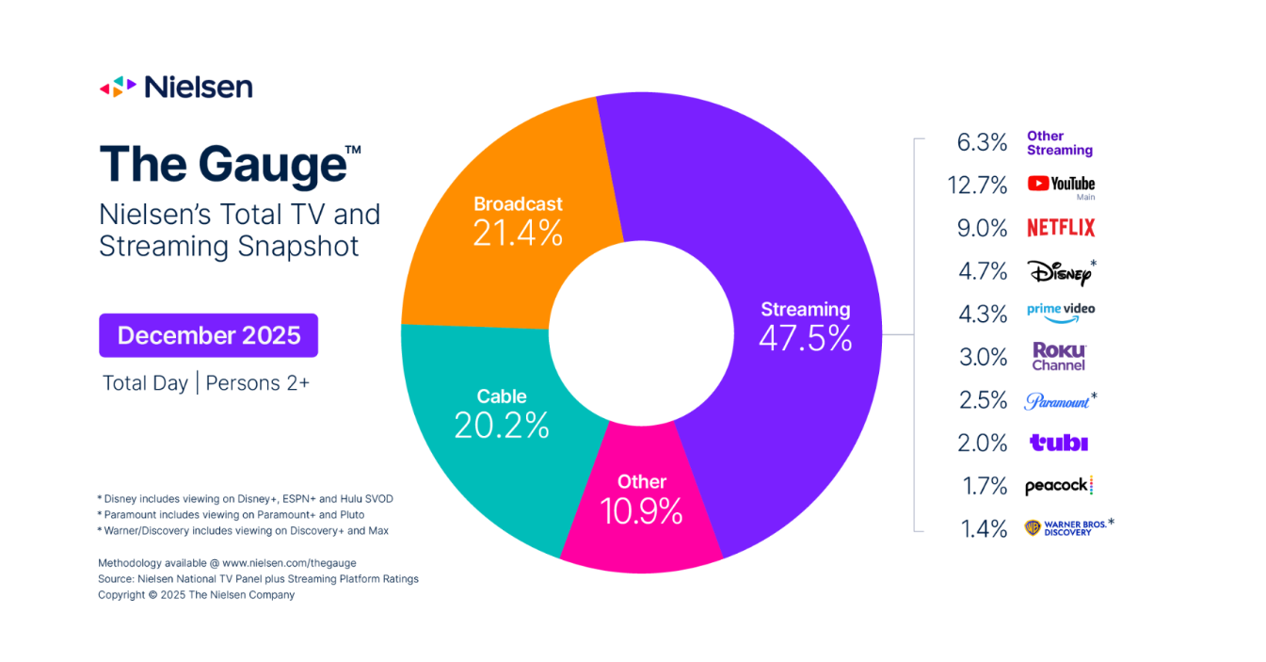



![[프리미엄 리포트] 미국 케이블TV 2025, 변화와 미래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directmedialab/2025/05/vj931j_20250527010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