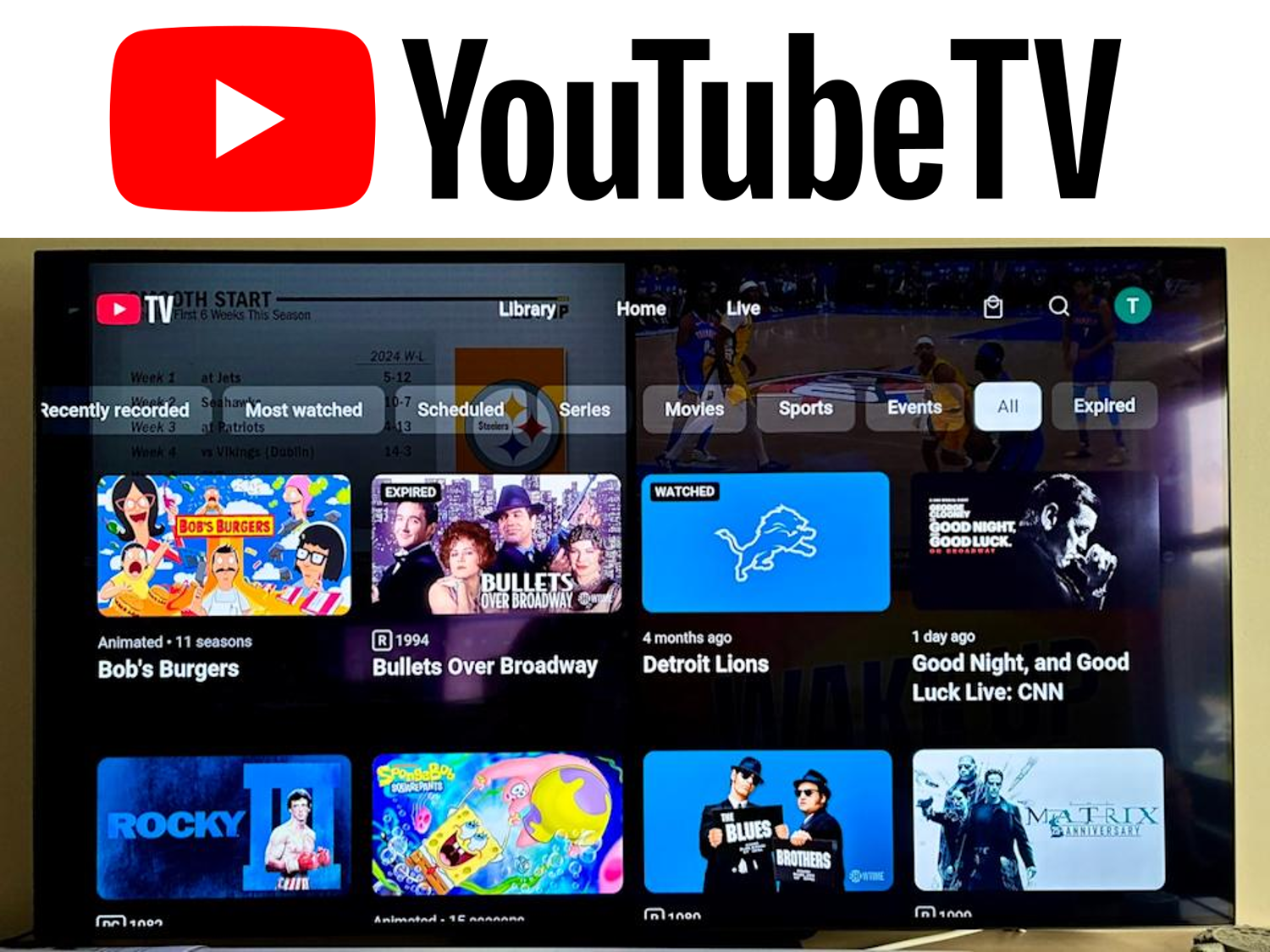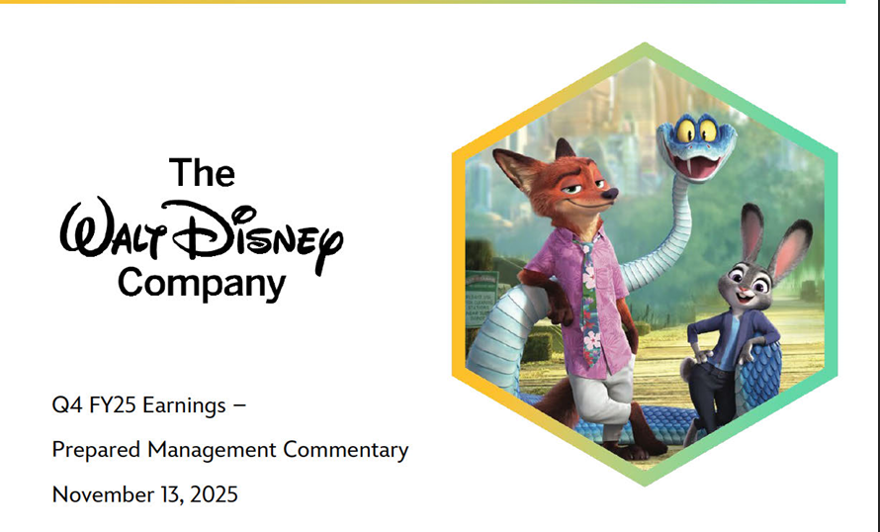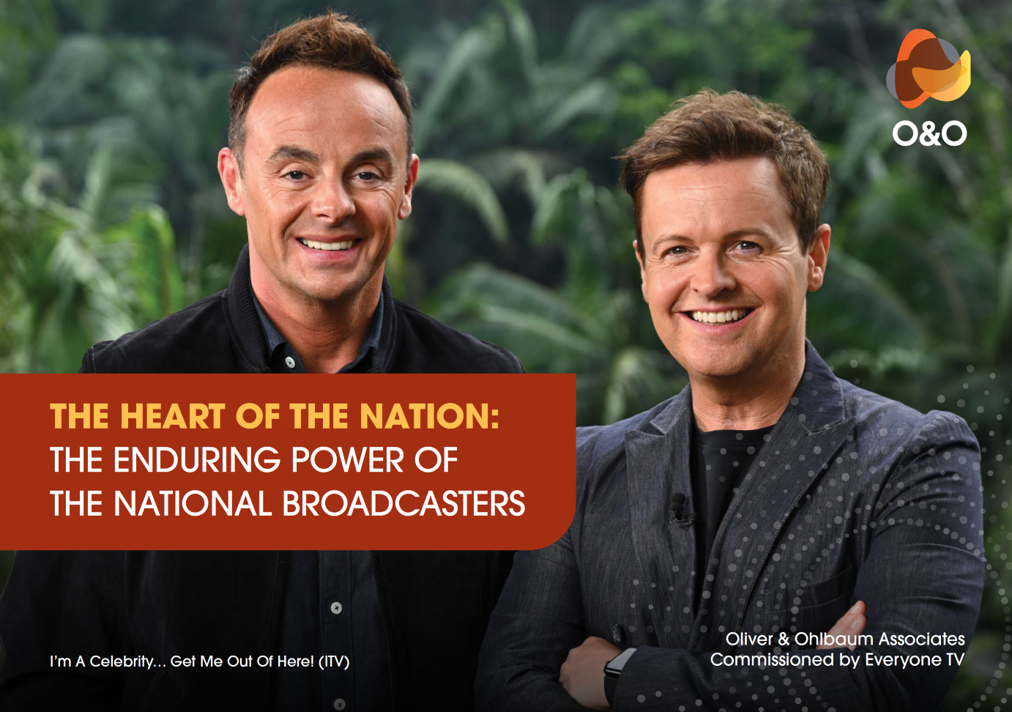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이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유럽 방송사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트리밍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 플랫폼 기업 ‘베드록 스트리밍(Bedrock Streaming)’이 있다. 유럽의 방송사들은 콘텐츠 중심의 직접 소비자 서비스(B2C)를 지향하기보다,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테크 기업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프랑스의 OTT 서비스 살토(Salto)는 실패했고, 베드록(Bedrock)은 살아남았다. 두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실패한 Salto, 살아남은 Bedrock
Salto는 2020년, 프랑스 주요 방송사인 France Télévisions, TF1, M6가 공동으로 출범한 OTT 서비스였다. 넷플릭스에 맞서기 위한 ‘프랑스판 넷플릭스’를 목표로 설립 했지만, 단기간에 이용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2023년 3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살토의 실패 원인으로는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 플랫폼 완성도 미흡, 그리고 유료 구독(SVOD) 중심의 단일 모델이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베드록(Bedrock)은 같은 시기 출범했지만, 전략부터 달랐다. 베드록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프랑스 M6 Group과 독일 RTL Group의 합작으로 탄생한 베드록은 방송사들을 상대로 B2B 기술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프리미엄 리포트] 미국 케이블TV 2025, 변화와 미래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directmedialab/2025/05/vj931j_202505270106.png)